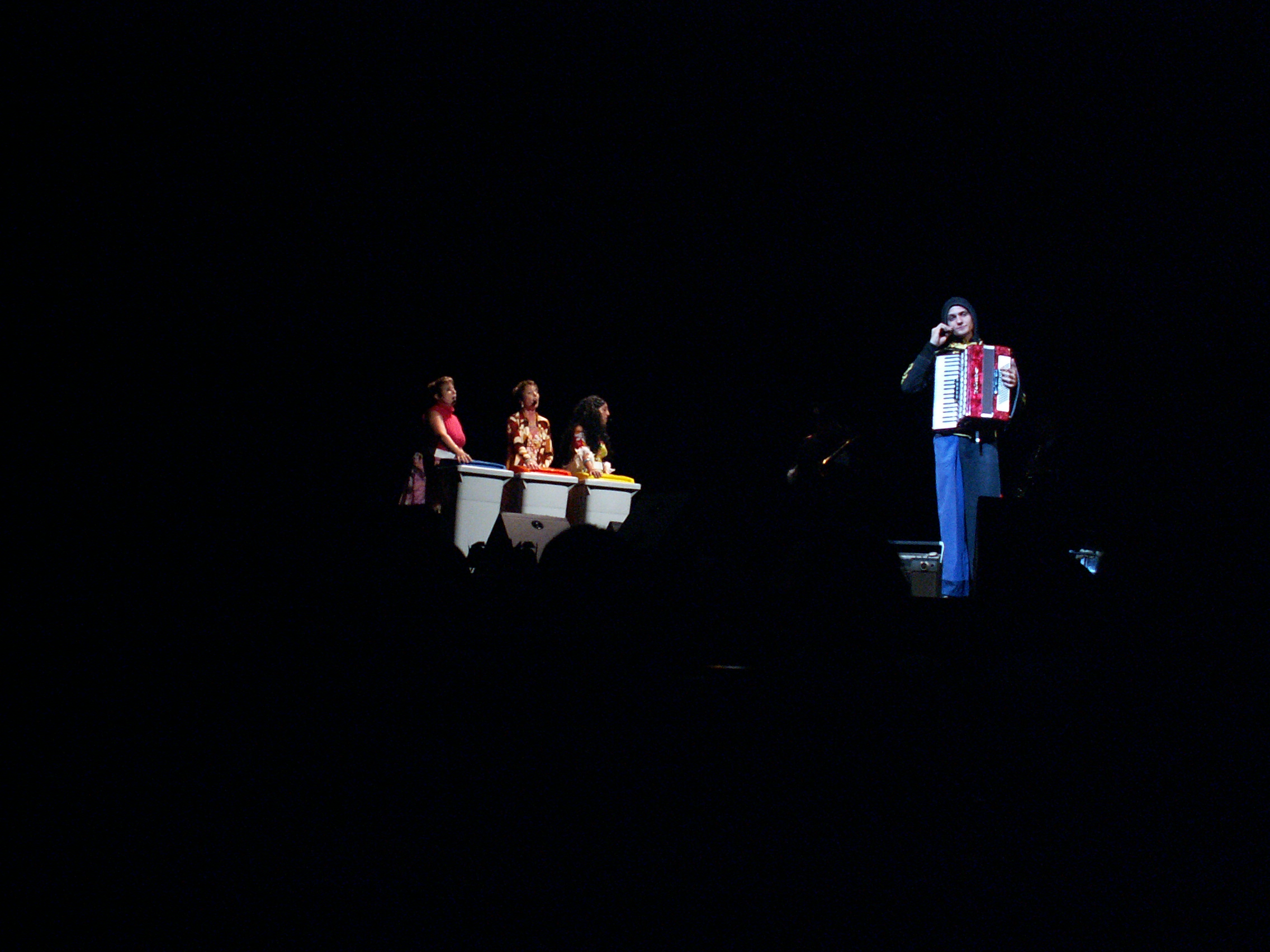음악이라는 매체는 그다지 친절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음악에 대해 어깨를 들썩거리게하는 브라스 사운드만 기억할 수 있다. 발칸과 집시의 음악이 정말로 그들의 생활이 행복하고 여유롭기 때문에 활발한 것이 아니라, 내일 인생이 끝날지도 모르는 불확실 속에서 오늘의 환상에 빠지는 그들의 불가피한 생활 태도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고란 브레고비치는 이야기 하고 있다. 이는 에밀 쿠스트리차가 고란 브레고비치의 음악을 빌어 영화를 통해 표현하려 했던 것이라 생각이 든다.
보다 이쁘게 가다듬고 무대 장치에도 공을 더들일 수 있지만,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하이파이적인 접근 방식은 집시와 발칸의 혼을 버리는 것일 수 있다. 드럼 스틱은 정말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고, 사운드 메이킹도 투박한 질감을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가끔은 중얼거리듯한 한탄조의 나레이션도 여과없이 넣었으며 여전히 무대와 관객들과의 거리는 수시로 사라졌다. 무엇보다도 공연의 분위기를 한단계 업시킨 것은 카르멘을 두고 두 남자가 자신의 밴드로 사랑을 얻으려할 때, 각자의 밴드가 1인 2역을 하기 위해 좌우가 다른 색상의 의상을 돌아가면서 보여줄 때였다. 물론, 거기서부터 브라스의 에너지는 증폭되기 시작했고 하일라이트의 열기 속에 빠져들 수 있었다.
고란 브레고비치는 참으로 영리한 아티스트라는 생각이 든다. 그의 오늘 공연엔 상당히 많은 기호와 상징들이 숨어있는 것 같다. 포주의 이름이 차우셰스쿠이며 그 역에 잉글랜드 추리닝을 입혀놓은 것 역시 정치적인 그의 판단이 개입된 것으로 생각이 든다. 이처럼 공연 속에 그가 표현한 기호 속에는 집시와 발칸의 전통과 무의식을 다른 세상의 사람들에게 알리는 한편 그것이 동시대에 어떻게 살아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상업성과 예술성, 그리고 자신의 소신과 대중의 생각 사이를 절묘하게 줄타기를 하며 자신과 자신의 소신에 대해 설명하는데에도 절대 인색하지 않았으며 자신감으로 가득차있다. 우리나라에 그와 비슷한 아티스트가 있다면 김수철이다. 충분한 천재성을 가졌음에도 이런 부분이 부족했기에 뭔가 아쉬움이 남는 아티스트이다. 물론, 여전히 우리에게는 최고의 자산임에도 틀림없지만.
p.s. 양복을 입으니 그전 공연의 개그 컨셉과 다르게 예상외로 상당히 준수하게 생긴 사람들이었다. 물론, 간지나는 젊은 청년의 압도적인 인기는 한 트럭 분량의 다른 아저씨들의 인기를 넘어섰지만.
p.s.2 내년에 Youssou N'Dour를 모셔온다고. 고맙습니다. LG아트센터.
상당히 모험수임에도 아프리카 최고의 아티스트 중 하나를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한 주최측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LG아트센터에서 이번주에 본 두번의 공연에 성을 밝힐 수 없는 뮤지션 *적을 볼 수 있었다. 영어권을 벗어난 다양한 음악적 경험은 우리의 예술적 토대가 어떻게 넓혀질 수 있는지 좋은 힌트를 제시하리라 기대한다.
'공연 > 기타등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리 릿나워 & 데이브 그루신-세종대 대양홀, 2006/12/1 (0) | 2006.12.02 |
|---|---|
| 파리의 재즈 클럽 빌보케(Bilboguet) 접수기 (0) | 2006.09.18 |
| 고란 브레고비치 - 성남아트센터, 2006/8/31 (0) | 2006.09.01 |
| 로스 반 반 - 예당, 2006/8/30 (0) | 2006.08.31 |
| 히로미 - LG아트센터, 2006/8/29 (3) | 2006.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