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벌써, 그 시절에 개러지가?
울퉁불퉁하게 질러되는 괴성과 마구잡이로 튀기는 자갈부스러기의 질감. 펑크의 날카로움은 아니었고 개러지에 조금은 가까운 듯 했으며 정말로 비슷한 아티스트는 찾기 힘드었다. 보컬이 투박한 구어체의 한국어 가사에 기인한다고 해도 사운드 자체도 아주 독창적이었다. 곰곰히 생각해보면 아주 단순한 '기타로 오도바이 타자' 역시도 창의적이다. 누구나 다 생각해낼 수 있지만 아무도 못해낸. 특히 오도바이가 오토바이가 아니라 오도바이가 아닌 것도 흥미롭다. 앞 뒤의 타에서 악센트를 주고 오도바이에서 부드럽게 넘어가주고 받침이 없는 단어를 통해 반복악절 자체의 독특한 그루브를 살려내었다. 이런 그루브는 영국놈들도 못한다. 영국놈들은 한국말을 모르기 때문이다. 1부의 서정성과 달리 2부는 날이 서있었다. 사실, 1부에 가장 돋보이는 이는 또 다른 기타리스트였던 하세가와 였다. 김창완의 원맨쇼를 예상했지만 실제로 리얼로커는 둘째 김창훈이었으며 메틀 형님의 오바액션을 연상시키는 각종 쇼를 선보였다. 나가면서 어떤 아주머니 曰, 저 아저씨 목 찢어지는 줄 알았다. 반면, 김창완은 오랜 라디오 DJ경력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달변이고 문학적 감수성이 깊은 듯 했다. 이런 후천적으로 체득된 문학적 감수성은 산울림의 독특한 노랫말을 만드는데에 일조하였을 것 같다. 1부를 마치고 드라마에서 호흡을 맞춘적이 있는 최강희가 노래를 불렀다. 자주 있는 공연도 아닌만큼 게스트는 후배 뮤지션이 되었어야 했으며 이는 어쩌면 한국 대중음악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예이다. 하세가와씨는 한국사람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적어도 하세가와 씨와 같은 기타리스트가 한국에 좀 있어야 했다. 독창적인 한두명의 아티스트는 있었지만 그것이 발전할 '씬'이라는 공간이 없다는 것. 영국애들이 왜 잘하겠는가? 슬리퍼 끌고 나가면 롤링스톤즈, 레드제플린을 볼 수 있는 곳과 직직거리는 백판으로 접할 수 있는 것과는 하늘과 땅차이가 아닐지? 이는 산울림과 같은 선배 뮤지션과 후배뮤지션, 그리고 음악대중들의 총체적인 문제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공연 중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은 산울림 매니아라는 동호회에서 산울림 티셔츠를 입고 왔다는 점이며 많은 아저씨, 아줌마들이 앞으로 나가서 열광적인 호흥을 보냈다는 점이다. White Stripes나 다름없는 거친 사운드에도. 그리고 히트곡도 많았다. 매니아와 일반 대중들 그리고 음악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었던 아티스트였지만 후대에 음악적 영향력은 아쉬운 밴드가 바로 산울림이 아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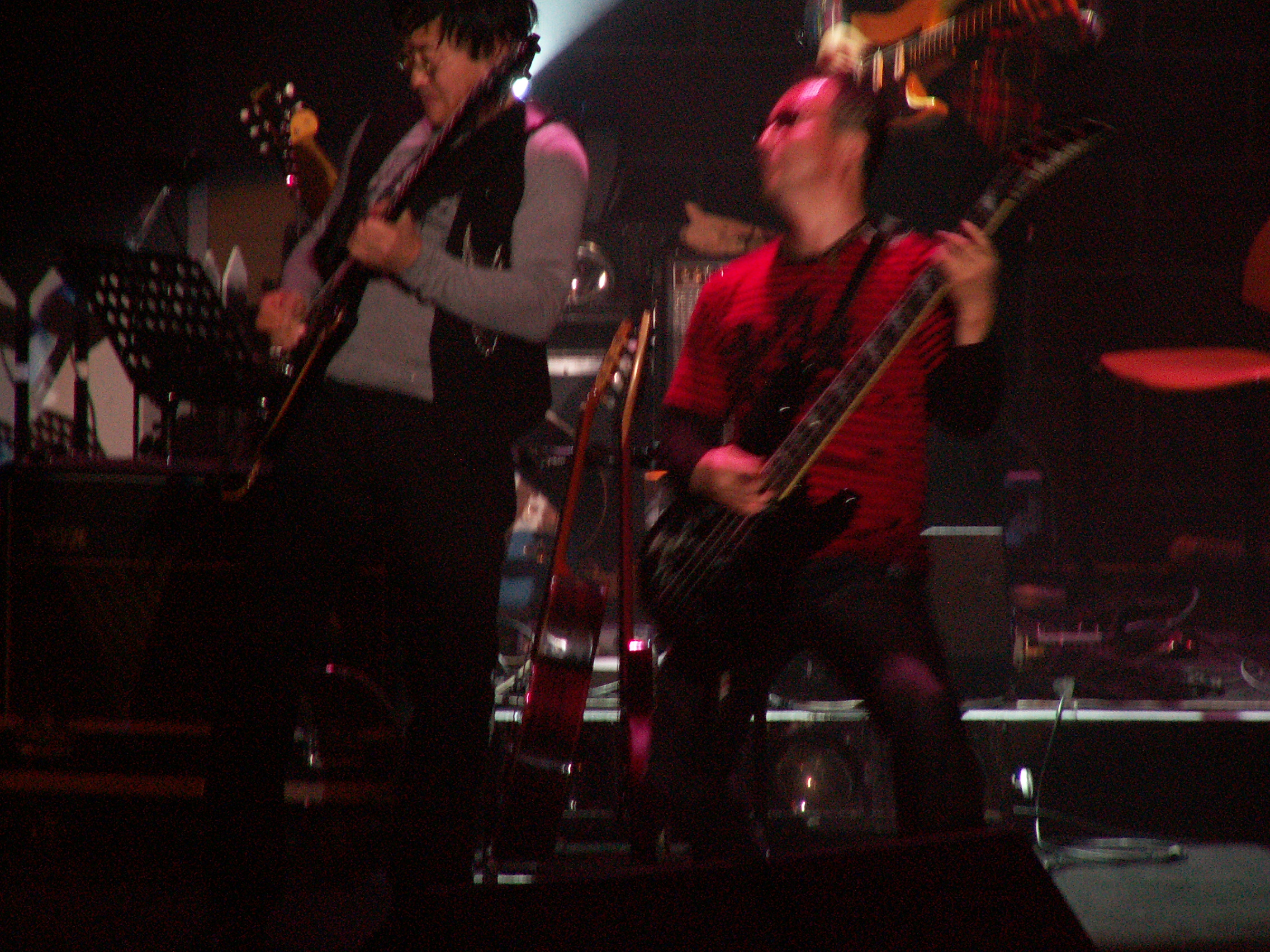































'공연 > 땅밑에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별, 클럽쌤, 2007/8/8 (0) | 2007.08.09 |
|---|---|
| 코코어-클럽쌈, 2006/12/31~2007/1/1 (0) | 2007.01.01 |
| Prelude - Evans, 2006/12/22 (0) | 2006.12.23 |
| 나윤선, 극장 용, 2006/11/19 (0) | 2006.11.20 |
| 광명음악밸리축제 (0) | 2006.06.28 |

